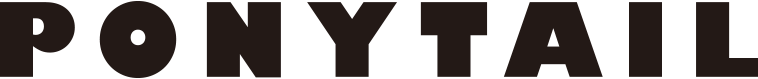38년 된 연남동 달걀 가게
벌써 3번째다. 높아진 월세로 친구가 연남동 작업실을 뺀 이후 꽃집이 들어오나 싶더니 어느새 식당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는 옷 가게로 공간의 이력이 3번이나 달라진 것. 동네 친구도, 즐겨 가던 단골집도 자꾸만 사라지는 연남동에서 ‘변치 않는 것’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연남동 달걀 가게, 경기상회의 존재는 남다르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38년간 연남동의 풍경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가좌동과 연남동을 가르는 연남교에서 경의선숲길 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경기상회 계란총판’이라고 쓴 강력한 붓글씨체의 간판과, 드넓은 들판을 노니는 닭 그림을 만날 수 있었다. 세련된 느낌은 아니었지만, 왠지 정감이 가는 동네 풍경. ‘이런 곳에 달걀 도매점이 있네’, 신기하긴 했으나 연남동의 목 좋은 곳에 있으니 다른 가게들처럼 커피숍이나 식당으로 곧 바뀌겠구나, 그렇게 무심히 지나쳐갔다.
하지만 연남동 일대가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와중에도 이 달걀 가게는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켰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강력했던 붓글씨체 간판을 정갈하게 리뉴얼도 했다. Since 1984라는 태생을 무심한 듯 쓱 덧붙이며.
대형마트에서 동네달걀가게로
38년 된 달걀가게를 인상 깊게 지켜만 보다가 직접 문을 두드린 건 최근 일이다. 고병원성 AI가 확산된 이후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한 달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였다. 인터넷에 달린 150여 개가 넘는 방문자 리뷰도 근거가 되었다. 하나같이 달걀이 신선하고 실하다는 이야기. 그렇게 나는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달걀가게에서 달걀을 공수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처음에는 기사식당도 많고 도매 수요가 많았어요.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진짜 하루에 5톤 차량으로 몇 번씩 운반했었으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이 개장한 게 1998년이니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당일 산란한 신선한 달걀만 취급한다’는 모토 아래 연남동 일대에 둥지를 튼 지 38년이 되어가는 경기상회. 도매 비중이 90% 이상이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소매로도 판매한다. 다른 동네로 이사한 후에도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하긴, 한 동네에서 40여 년 가까이 영업을 한다는 건 신뢰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테다. 인터넷에 리뷰가 달린 것조차 몰랐다는 사장님의 말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우리동네의풍경을유지하는것들
실제 먹어보니 중간 유통 과정 없는 양계장 직송 달걀이라 확실히 신선했다. 용인, 동두천, 포천 등에 있는 양계농장에서 매일 달걀을 공수받는데 이곳들과도 30년 넘게 인연을 맺고 있다. 달걀은 생물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장님의 이야기. 영하 10도가 넘는 한겨울에도 매장 내부에 난로 하나 켜지 않는 것은 신선한 달걀에 관한 그들의 융통성 없는(!) 태도를 보여준다. 당일 산란한 달걀만 취급하기 때문에 산란일이 며칠 지난 마트 달걀과는 오히려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줘서 고맙다’는 농담 섞인 단골손님들의 인사말을 자양분 삼아 연남동에서 38년째 그 풍경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동네 사람들은 양계농장을 직접 가지 않아도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고 말이다.
물론 오래된 풍경만이 좋은 건 아니다. 연남동을 가로지르는 철길에 수시로 기차가 다닐 때는 소음과 분진 때문에 고생했지만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어 조용하고 쾌적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동네 사랑방이었던 목욕탕이 없어지고, 오래된 빵집이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으로 바뀌고, 동네의 표정을 만들어왔던 사람들이 떠밀려 나가는 건 유쾌하지 않은 일이다. 그 변치 않는 거점들이 곧 내 일상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하기위한노력
동네 달걀 가게, 경기상회 덕분에 내 식탁의 달걀은 훨씬 더 신선해졌다. 한국인의 1인당 연평균 달걀 소비량은 13,400g. 달걀 1개의 무게를 50g이라고 계산하면 1년에 268개의 달걀을 먹는 것이니 달걀은 꽤 관여도가 높은 식재료다. 아무 생각 없이 대형 마트에서 달걀을 사던 때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일상의 정보도 늘었다. 달걀을 씻으면 껍질에 있는 난각보호막이 사라져 빨리 상한다는 것도, 알이 큰 것보다 중란 이하의 달걀이 더 맛있고 고소하다는 것도 동네 달걀 가게에서 알려줬다. 물론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있다. 오후 4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달걀을 사려면 시간 안배를 잘해야 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도매업 병행으로 오전 5시 30분에 문을 열기 때문에 오후 4시에 문을 닫아도 근 10시간 넘게 영업하는 셈이다. 전날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집 앞에 물건이 배송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방식이 아니다. 지금 가고 있으니 4시 5분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경기상회 단골들의 전화가 낯설지만, 지속가능한 토대로 읽히는 이유다.
나와당신으로부터만들어지는동네풍경
매일 가던 동선이 아닌, 조금 색다른 길로 타박타박 당신의 동네를 산책해보길. 연남동 달걀 가게처럼 오래도록 그곳에 있어 줬으면 하는 풍경들이 있다면 주저 없이 문을 두드려보자. 내 삶의 반경에 변치 않는 거점들이 존재할 때, 그 안에서 일상의 환대가 오고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작은 뿌리를 내린다. ‘동네’라는 단어에서 오는 안온함은 그렇게 나와 당신으로부터 만들어진다.
—————
글. 김선미
서울 연남동에서 기획 및 디자인 창작집단
포니테일 크리에이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단행본 ‘친절한 뉴욕’, ‘친절한 북유럽’,
‘취향-디자이너의 물건들’,
‘베이징 도큐멘트’를 썼으며 한겨레 신문,
월간 샘터 등에서 디자인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현재는 1930년대 한국 근대 잡지에 관한
단행본을 집필 중이다.
사진. 양경필